어느 날 새벽기도 갈 시간을 놓치고 그만 늦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배시간은 절반이나 지나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성도님들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하며 무척 걱정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 어느 노인 권사님이 곁에 와서 가만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시계를 믿으면 까딱하면 실수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는 시계를 믿지 않고, 새소리를 듣고 일어난답니다. 새들은 틀림없어요!”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 그 새들을 목사관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목사관 이층 아이들 방안에 작은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어서 무심코 치웠는데, 조금 후에도 같은 장소에 또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변을 살펴보니, 창틀에 올려놓은 에어컨디셔녀 밑의 공간에 수북한 나뭇잎들과 가지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새들이 보금자리를 꾸미기 위하여 부지런히 나뭇가지들을 주위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우연하게 새들의 보금자라를 꾸미는 모습을 보고는 참으로 기뻤었습니다. 아마도 그 노 권사님이 새를 목사관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남편에게 이 굉장한 소식을 알리고는 괜스레 홍분되었습니다. 옆에만 가도 날개를 펄럭이며 민첩하게 비상해 버리는 새와 한집에서 산다는 일은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새와 저는 특별한 계약관계는 없을지라도 그 청아하고 명랑한 음성으로 새벽을 일으킬 것이며, 밤을 재울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맑은 스카치 테이프를 창틀 사이에 칸막이로 붙여 놓고는 새 들의 등지 짓는 모습을 몰래몰래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하고 알뜰하게도 새들은 어여쁜 둥지를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언제 낳았는지 고동색 점박이가 찍혀진 네 개의 알을 낳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들여다보니, 네 마리의 새끼들이 눈도 못 뜬 채 입을 벌리고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들에게 먹이를 물리고 있으면, 아빠 새는 주변을 멀찌감치 돌면서 망을 봅니다. 그러고는 어미새가 먹이 주는 일이 끝나면 자리를 바꿔 아빠 새가 한 차례 새끼들을 둘러보고는 또 다시 먹이를 찾아나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에 한 마리 새끼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새가 죽었을 때, 성지를 들여다보았던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생과 사의 아픔이 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참지 못하고 새끼들이 얼마나 컸는지 들여다보아야만 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새들의 집은 고요 속에 비워져 있었습니다. 새들이 떠나 간 빈 둥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남쪽의 광활한 나무 숲을 향해 비상하고 있을 새들을 생각하며, 저 자신도 새가 되어 그들과 함께 멀리
멀리 날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갔던 새들도 이듬해 봄이 되면 또 찾아와 주었습니다. 새들이 찾아오니, 목사관 뒷마당의 나뭇잎들도 앞다투어 피어나고 아이들의 공놀이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미만큼 자란 새들이 보금자리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장난질을 하고 부산하게 하여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함께 사는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 에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한 가지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그들의 몇 가지 언어를 터득했습니다. 평소에 부르는 소리, 다람쥐가 나타났을 때 방어하는 소리, 먹이를 찾으러 가자고 조르는 소리 등 다양한 음색의 높낮이로 서로를 부르고 찾는 소리가 목사관에 종일 울려퍼졌습니 다.
새와 인간,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공존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6월의 장미가 담장을 넘으며 그 달콤한 꽃 향기를 토함이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꽃들을 노래하는 새들이 있기 때문입니 다. 닫혀진 마음과 고요한 자연의 창문을 경쾌하게 열어주며, 절망한 인간의 날갯죽지에 희망을 안겨주고, 침체된 영혼의 호수에 파문을 그리게 합니다. 덧없이 잦아드는 영혼에 하늘을 향한 비상을 서두르게 합니다. 너무 작아 노래하지 않으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새들에게 노래가 있기에 더욱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새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같이 자유하고, 새 같이 노래하고, 새같이 민첩하며, 새같이 청아한 마음으로 내 곁으로 다가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어디선가에서 새의 음성을 듣고 새벽이면 깨어나신다는 권 사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새들은 틀림없어요” 하시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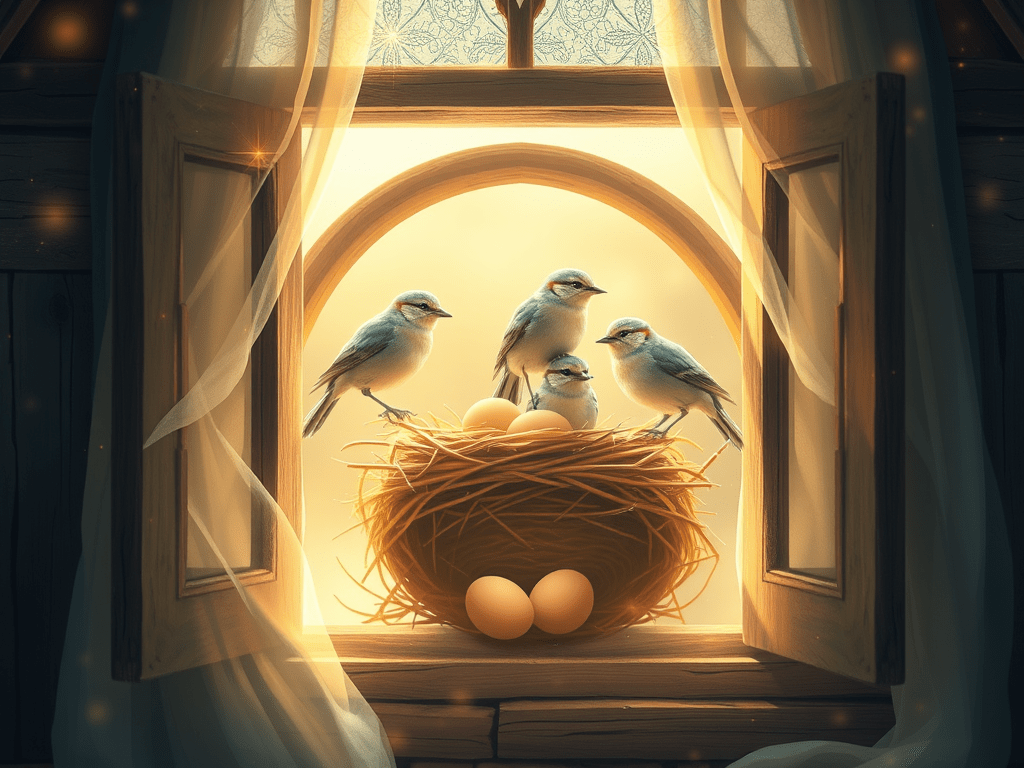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