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마 현실을 벗어난 길을
혼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을 거야.
여긴 푸른 불빛 화면도 아니고
로켓이 찍고 가는 우주의 길도 아니지.
베드로과 안드레가 함께 서서
온 세상을 한눈에 굽어보는 곳,
이스탄불에 파나르, 그 높은 자리에 서면
조용히 자라나는 게 하나 있어.
전쟁을 내려놓고, 주먹을 펴고,
평화와 사람다운 권리를 걸어 보려는 마음,
어깨를 맞대고 살아 보려는
우리의 마지막 믿음 같은 것
2025년 수수감사절 주말에,
시간은 쉬지 않고
새 소식을 실어 내 눈꺼풀에 기대고,
사진과 영상이 실처럼 이어져 흘러와.
어젯밤엔 백만 개의 날개가
문 앞까지 찾아왔지.
나는 그것들을 받아 들고
바닷가에서 바닷가까지 걸었어,
아직도 미완성인 천사처럼 높이 떠서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
오늘은 더 뜨거운 선물을 받았어,
바로 태양이었지.
갈라지고 흩어지고 요란하던 재와 소음이
한 번에 무너지는 잿더미 언덕처럼
한순간에 터져 사라졌어.
한때 신조와 맹세 속에서
동과 서를 갈라 놓았던 틈이
이제는 하늘이 허락한 만큼
다시 잇대어 붙는 것만 같아.
그렇게 그날이 왔어,
서리 내리듯 조용히 왔지.
으름장 놓는 장군도,
소리만 큰 목회자도,
뒷방에서 점치는 무당도,
마술처럼 믿음을 다루는 교회도
팔을 쭉 뻗어 쥘 수는 없는 무엇이
우리 품 안으로 떨어져 왔어.
형광등 아래 뒤척이며
전선에 매달려 살아 온 이 세기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버티고 있던 약속,
크루베라 동굴 같은 어둠을
서서히 기어 올라와
마침내 지상 바람을 들이마시는 약속이었지.
옛 이야기들은 땅속에 묻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
들판 위에 피처럼 번진
가인과 아벨의 비극,
떨어져 다시는 마주 보지 못한
이스마엘과 이삭,
쌍둥이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
이름 하나를 두고 씨름하던
야곱과 에서,
상처를 딛고 새 결실을 향해 돌아선
요셉의 전환점,
망명지에서 불꽃에 이끌려
다시 부름을 받은 모세,
남과 북의 긴장과 예루살렘의 붕괴,
쇠사슬에서 풀려나
반쯤 무너진 성읍으로 돌아오던 발자국들,
어딘가에 그려 두었던 새 왕국의 윤곽,
먼지와 돌부리에 험하게 패인
구원의 길,
예수와 그 이름을 이고 진 교회까지—
모두를 지나
결국 남는 기도는 하나뿐이야.
그리고 1700년이 흐른 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함께 머물 자리를 찾게 하소서,
지켜보는 세상이
비로소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떠오르는 법을 배울 거야.
숨 쉬는 속도 그대로
느릿느릿 날아오르며
그늘과 햇살이 반쯤씩 섞여 있는
넓은 나라를 향해 가겠지,
서로의 얼굴을 다르게 가진 이들이
마침내 하나의 잔치가 되는 곳으로.
더는 닫힌 방은 싫어.
무당이 앉은 방도,
아이들이 파란 불빛 아래 모여드는 피시방도,
숨 막히는 시험 방도,
밤새 노래를 쏟아 내는 노래방도,
술잔 소리로 새벽을 버티는 술방도,
무쇠 자물쇠로 잠근 공포의 방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나는 작은 집 문고리를 잡고 나갈 거야.
집이라는 곳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니까.
나는 하늘에 흩어진
셀 수 없는 별들 가운데
그저 하나가 되려고 해.
저 멀리, 눈에 닿지 않는 은하 너머의 불빛들까지도
어쩐지 서로 한 동네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 가슴 한켠에 모여 살고 있어.
멀리멀리 떨어져 떠 있는
그 셀 수 없는 빛들이
마침내 한 동네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접혀 드는 거야.
© 윤 태헌, 2025년 추수감사절 주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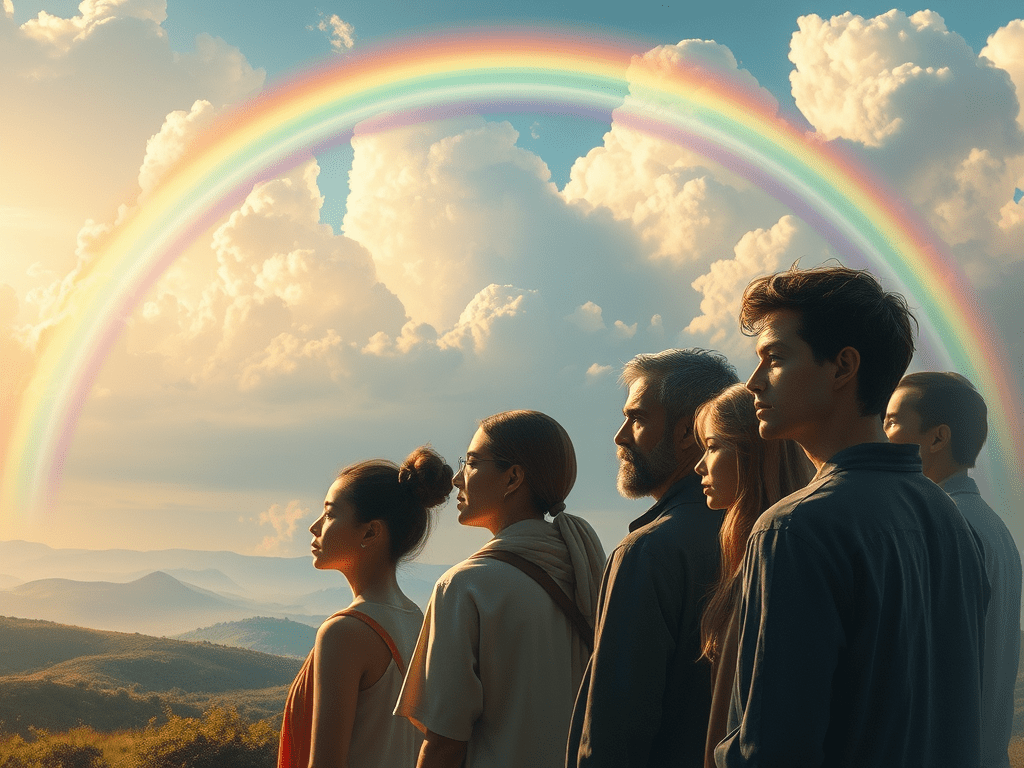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